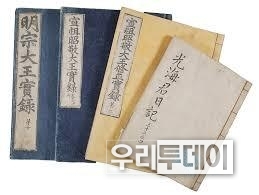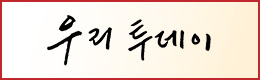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세종 69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7월 7일(병자) 3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사은사(謝恩使)인 화천군(花川君)권공(權恭)이 돌아오다가 평안도에 이르러 부친상의 소식을 듣고 강계(江界)로 급히 달려갔다. 권공이 돌아올 때에, 이미 황제에게 사퇴를 고했는데, 황제가 특명으로써 그를 부르고 친히 좌순문(左順門)에 나와서 권공을 앞으로 나아오게 하고는 가까이 와서 대면하여 보고 위로하기를,
“그대의 국왕이 지성으로 중국을 섬기고, 그대도 또한 먼 길에 오면서 고생하였다. ”
하면서, 옷 한 벌과 각색 단자(段子)·나사(羅紗)·견(絹) 각 5필과 은 50 냥(兩)과 꽃을 아로새긴 순금대(純金帶) 1개, 사모(紗帽)·목화[靴] 1개, 지폐(紙幣) 10덩이[塊]를 내렸었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공이 특별히 새 황제의 후한 은혜를 입었으니, 지나간 옛날에는 없는 일이다. 중국에서 우리 나라에 향하는 마음이 지극한 때문이다. ”
고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22책 69권 2장 A면
【영인본】 3책 640면
【분류】 *외교-명(明)
문종 10권, 1년(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10월 17일(임오) 4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청평위(淸平尉)이백강(李伯剛)이 졸(卒)하였다. 이백강은 청주(淸州) 사람으로서, 고려(高麗) 평장사(平章事) 이공승(李公升)의 후손이요, 이거이(李居易)의 아들이다. 나이 17세에 음보(蔭補)로 별장(別將)이 되고, 기묘년2988) 에 감찰(監察)에 임명되었다. 당시 우리 태종(太宗)이 잠저(潛邸)에 있으면서 골라서 사위로 삼았다. 이어서 병조·형조 두 조(曹)의 좌랑(佐郞)에 전보되었다. 경진년2989) 방간(芳幹)의 난(亂)에 이백강이 태종을 모시고 보좌한 공이 매우 많았으므로, 난(亂)을 평정하고 공(功)을 의논할 때 이백강의 이름도 또한 끼었다. 태종이 말하기를,
“이백강은 나의 사위이니, 그를 제수(除授)하라.”
하여 이듬해에 우장군(右將軍)을 제수하고, 얼마 안되어 대장군(大將軍)으로 옮겼다. 태종이 즉위(卽位)하여 청평군(淸平君)에 봉(封)하니, 품계가 숭정 대부(崇政大夫)이었다. 병신년2990) 에 숭록 대부(崇祿大夫)의 계급을 더하고 무술년2991) 에 대광 보국(大匡輔國)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에 오르고, 갑자년2992) 에 다시 유록 대부(綏祿大夫)로 고쳤다. 경오년2993) 에 또 유록 대부(綏祿大夫) 청평위(淸平尉)로 고치고, 예에 의하여 궤장(几杖)을 내렸다. 졸(卒)하니, 나이가 71세였다. 2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관(官)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백강은 청렴하고 결백하며 온화하고 근면하였다. 항상 사는 곳에 따로 한 방을 치우고 부모의 초상을 안치하고, 삭망(朔望)에는 반드시 전(奠)을 드렸다. 일찍이 두 번이나 중국에 갔었는데, 행차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었다. 종자(從者) 가운데 〈황제가〉 하사한 지폐[鈔]를 가지고 약재(藥材)를 사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백강은 말하기를, “황제께서 내려 주신 것이니, 가지고 돌아가 우리집의 가보(家寶)로 삼겠다.”
하였으니, 대체로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신에 누(累)가 되게 하려 하지 아니함이었다. 남이 주는 것도 받지 않고, 사사로이 남에게 구하는 것도 없었다. 작은 정자(亭子)를 짓고 주위에 화초를 심어 소요(逍遙)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을 하루의 일로 삼았으므로, 부마(駙馬)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었다. 시호(諡號)를 정절(靖節)이라 하니, 너그럽고 즐거워하면서 아름답게 끝마친 것을 정(靖)이라 하고, 청렴하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극기(克己)하는 것을 절(節)이라 한다. 아들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계린(李季疄)에게 출가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1장 A면
【영인본】 6책 447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비빈(妃嬪)
[註 2988]기묘년 : 1399 정종 1년. ☞
[註 2989]경진년 : 1400 정종 2년. ☞
[註 2990]병신년 : 1416 태종 16년. ☞
[註 2991]무술년 : 1418 태종 18년. ☞
[註 2992]갑자년 : 1444 세종 26년. ☞
[註 2993]경오년 : 1450 세종 32년. ☞
세조 29권, 8년(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10월 9일(경오) 4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일본 국왕(日本國王)원의정(源義政)이 중 순혜(順惠) 등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쳤다. 그 서계(書契)는 이러하였다.
“기력이 좋으시다니 기쁜 마음 간절합니다. 요즘 왕래하는 선편(船便)이 끊겨서 사절(使節)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보초(寶鈔)5902) 를 배에 가득히 싣고 운반해 가서 물화를 유통하는 이익을 얻으니, 다행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이제 듣건대 귀국(貴國)에서 보낸 선박이 험한 풍파를 만나 일본 지경에 이르기 전에 행방을 잃었다고 하니, 천명(天命)입니까? 탄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나라는 화친하는 길을 닦기 위하여 글을 가지고 노통사(盧通事)에게 붙여서 속히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이봉(泥封)5903) 을 받아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면 다행함을 이길 수 없겠습니다. 또 근년에 북쪽 오랑캐가 사변을 기도하였으나 싸우지 아니하고 공을 이루었다고 하니, 왕화(王化)5904) 의 귀한 바와 위광(威光)의 성한 것은 다른 나라와 다르니 어찌 감사하고 다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원만원 정선 법사(圓滿院淨善法司) 대명국 천동 제일위(大明國天童第一位) 기외용 선사(機外用禪師)를 차견(差遣)하여 비로법보(毘盧法寶)를 구합니다. 대저 우리의 서울 대화주(大和州)에 교사(敎寺)가 있는데 바로 천태종(天台宗)의 웅거지(雄據地)였습니다. 병화(兵火)를 만나 불타버리고 장전(藏殿)까지 연소되었는데, 이 절을 복구함에 당하여 장경(藏經)이 미비하므로, 하나의 장경이라도 본산(本山)에 안치하여 복을 심는 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전(銅錢)을 거듭 내려 주시어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물며 귀국(貴國)은 아끼는 마음이 없어서 매양 구하면 허락해 용납하니, 그 덕(德)은 진실로 이웃이 있는 것이므로 진심으로 사례하여 마지 아니합니다. 후하지 못한 토의(土宜)5905) 가 별폭(別幅)에 있으니, 받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기후에 따라 몸을 보중하여 나라를 위해 목을 소중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 그칩니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17장 B면
【영인본】 7책 553면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註 5902]보초(寶鈔) : 지폐(紙幣) 이름. ☞
[註 5903]이봉(泥封) : 봉한 글. ☞
[註 5904]왕화(王化) : 임금의 덕화. ☞
[註 5905]토의(土宜) : 토산물. ☞
성종 30권, 4년(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5월 5일(을미) 2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형조(刑曹)에서 수교(受敎)에 대한 관문(關文)에, ‘ 지금 저화(楮貨)3024) 의 가치가 천(賤)하여졌는데, 무릇 징속(徵贖)하는 데는 오로지 저화만을 쓰니, 죄를 징계하는 것이 크게 가벼워졌으며, 본조(本曹)의 용도(用度)도 부족(不足)합니다. 청컨대 면포(綿布)와 저화(楮貨)를 서로 반씩 쓰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 등이 국폐(國幣)의 사용을 자세히 참고하건대 시대마다 각각 같지 않습니다. 저폐(楮幣)는 송(宋)나라에서 시작하여 원(元)나라에서 성(盛)하였는데, 제조하는 공역(功役)을 덜고 멀리 가져 가는 데에 편합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여러 고전(古典)을 참고하고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저폐(楮幣)를 행한 지 거의 수십 년이 되었고, 세조조(世祖朝)에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저화(楮貨) 1장(張)이 쌀 1되[升]에 준하는 법(法)을 세워 《대전(大典)》에 실었으니, 한결같이 징속(徵贖)하는 데에 전부 저화를 썼으며, 약재(藥材)를 전매(專賣)하는 데에도 서로 반씩 써서, 어기는 자는 모두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3025) 로 논단(論斷)하였고, 저자에서 매매(買賣)하는데 법을 어겨 쓰는 자도 위의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는 법이 이미 수교(受敎)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화를 관(官)에 들이는 길이 넓지 않고 저화의 가치가 천(賤)하여 민간(民間)에서 쓰려 들지 않고, 또 법사(法司)에서 징속하는 것도 법에 의거하지 않아 저폐(楮幣)가 장차 폐(廢)하여 없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하물며 형조(刑曹)에서는 도둑의 장물(贓物)까지도 겸하여 쓰고 있어, 한 관사(官司)의 용도가 부족한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대전(大典)》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5책 30권 3장 B면
【영인본】 9책 22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註 3024]저화(楮貨) :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용하던 지폐(紙幣). ☞
[註 3025]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에, ‘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음. ☞